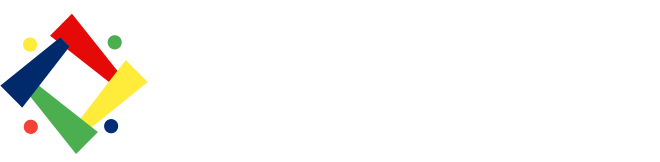맞춤법에 맞는 표기에서 좀 어렵다 싶은 걸 꼽아 보라고 하면 ‘사이시옷 표기’를 드는 경우가 많다. 표기에서 어렵다고 할 때에는 대개 환경은 비슷한데 왜 표기가 다르지? 하는 데에서 오는 헷갈림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사말’과 ‘존댓말’처럼 환경은 비슷해 보이는데(모두 ‘◯◯+말’ 구조이니까), ‘인사말’은 ‘인삿말’로 안 쓰고, ‘존댓말’은 ㅅ을 넣어 ‘존댓말’로 쓴다. 이처럼 ㅅ을 쓰는 말과 안 쓰는 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ㅅ(사이시옷)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에만 등장한다. ‘사이시옷’도 쉽지 않은데 ‘사잇소리 현상’은 또 무엇일까 하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살펴보자.
‘사잇소리 현상’은 일정한 환경에서 단어들이 원래 발음과는 다르게 소리 나는 것을 말한다. 다르게 소리 난다는 것은 첫째, 원래 된소리가 아닌데 된소리로 소리 난다. 둘째, ㄴ 소리가 원래 없었는데 ㄴ 소리가 끼어들어 발음된다. 이렇게 소리가 다르게 나는 현상은 단어와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에서 나타난다.
원래 된소리가 아닌데 된소리가 되는 경우는 제목에서 예로 든 ‘잔칫집’과 ‘잔치국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잔칫집’은 ‘잔치+집’, ‘잔치국수’는 ‘잔치+국수’로 똑같이 ‘잔치’가 들어가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이들을 발음해 보면, ‘잔치+집’에서는 ‘집’이 [찝]으로 소리가 난다. 즉, [잔치찝]이 된다. 그런데 ‘잔치+국수’에서는 ‘국수’의 ‘국’이 [꾹]으로 소리 나지 않고 그대로 [국]으로 소리 난다. 즉, [잔치꾹쑤]가 아니라 [잔치국쑤]로 소리 난다. 이제 사이시옷이 있고 없고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리라고 보는데,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 [잔치찝]처럼 원래 발음과는 다르게 소리 남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이다.
원래 ㄴ 소리가 없는데 합성어에서 ㄴ 소리가 하나(ㄴ) 또는 둘(ㄴㄴ)이 끼어들어 발음되는 현상도 살펴보자. 이러한 예로 위에서 말한 ‘인사말’과 ‘존댓말’을 들 수 있다. ‘인사+말’은 그대로 [인사말]로 발음되어 소리 변화가 없지만, ‘존대+말’은 [존대말]이 아니라 [존댄말]로 소리 변화가 있다. ‘존대+말’에서는 원래는 없던 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인사말’과는 다르게 사이시옷을 받치어 ‘존댓말’로 적는다. ‘비+물’도 [비물]이 아닌 [빈물]로 발음되어 ‘빗물’로 적는다. ㄴ 소리가 두 개 끼어드는 경우도 보면, ‘뒤+일’은 [뒤ː일]이 아니라 [뒨ː닐]로 소리 나므로 ‘뒷일’로 쓰며, ‘깨+잎[깬닙]’도 마찬가지여서 ‘깨잎’이 아닌 ‘깻잎’으로 쓴다.
이처럼 사이시옷 표기의 관건은 ‘발음 변화’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잔칫집/잔치국수’ 표기가 왜 다른지 이해할 수 있고, ‘인사말/존댓말’ 표기 차이를 말할 수 있다. 사이시옷이 쓰인 예들을 몇 개씩 더 보자.
(1) 된소리: 나뭇가지[--까지], 냇가[-까], 조갯살[--쌀], 자릿세[--쎄]
(2) ㄴ 소리: 아랫마을[아랜--], 뒷머리[뒨ː--], 훗날[훈ː-], 곗날[곈ː-]
(3) ㄴㄴ 소리: 베갯잇[베갠닏], 깻잎[깬닙], 나뭇잎[나문닙], 예삿일[예ː산닐]

사이시옷 표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이시옷을 빼고 ‘냇가’를 ‘내가’로 쓰라거나 ‘나뭇잎’을 ‘나무잎’으로 쓰라고 하면 어색하다고 할 텐데, 대개 이런 경우는 예전부터 봐 와서 눈에 익숙해진 단어들이다. 한편,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 전문 용어는 상대적으로 사이시옷 표기를 어색해한다. ‘최솟값, 절댓값, 주삿바늘’ 같은 예들이다. 사실 전문 용어가 아니더라도 사이시옷 없이 많이 써 온 ‘맥줏집, 감잣국’도 눈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에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가 표기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를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말 표기법을 체계화한 ‘한글 맞춤법’에 사이시옷 규정(제30항)이 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근거가 뚜렷한 사이시옷은 표기 조건에 들어맞는다면 표기함이 마땅하다.
사이시옷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사이시옷을 표기하면 발음이 분명해지는 이점도 있다. 예를 들어 ‘공기에 담은 밥’을 ‘공기밥’으로 쓰면 [공기밥]으로 발음할 수도 있고 [공기빱]으로 발음할 수도 있는데, 사이시옷을 넣어 ‘공깃밥’으로 쓰면 누구나 [공기빱]으로 발음하게 된다. 즉, 사이시옷이 있어서 정확하고 통일된 발음을 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표기 환경이 복잡하다고 느끼거나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낯설어서, 그리고 예외 사항도 있기 때문에(외래어가 포함된 단어에는 사이시옷을 안 쓴다거나, ‘횟수, 숫자’ 같은 2음절 한자어 몇 개에는 사이시옷을 쓴다거나 하는) 국민들이 사이시옷 표기를 어려운 대상으로 여김에 따라 사이시옷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국어심의회(2024. 12. 20.)’에서 ‘사이시옷 표기 규정 개선안’이 논의된 바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표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사이시옷 표기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선의 방향은 역사적인 표기인 사이시옷 표기를 인정하면서 한글 맞춤법 제30항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쪽이리라고 예상해 본다.
사이시옷 표기를 어렵다 안 어렵다로만 접근한다면 문법에 근거한 우리말 표기를 보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개선안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사이시옷이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합성어에만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합성어 뜻에 따라 발음을 달리했다는 점, 그렇게 달라진 발음을 ㅅ이라는 표기 장치로 나타내어 발음을 통일시켰다는 점들도 돌와봐 주자.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닌 언어 능력이나 감각을 방증하는 것이니 만큼, 좀 더 부드러운 시선으로 사이시옷 표기를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1. 교육방송[EBS] 비즈니스 리뷰 '한 번 배워 평생 쓰는 비즈니스 언어'

2. 교육방송[EBS] 평생학교 '품격 있는 문장 수업'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