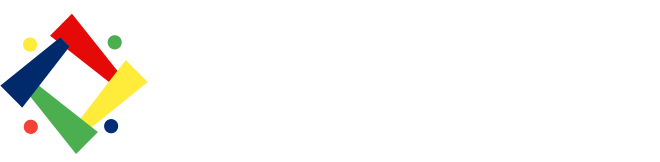2026학년도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시험이 지난 목요일에 완료됐다. 수능 날 아침이면 대한민국의 시계는 늘 고3 학생들을 향해 돌아간다. 도시 전체가 시험장으로 변하고, 모든 뉴스가 ‘수험생’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만큼 수험생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뜨겁기만 하다. 수능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한동안 수험생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한다, 어디를 가도 수험생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지속된다.
그러나 그날, 누군가의 열아홉은 시험장에 있지 않다. 영화 〈3학년 2학기〉가 보여준 장면처럼, 특성화고(실업계고)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이른 새벽 버스에 몸을 싣고 취업 현장으로 향한다. 어떤 학생은 자신이 만든 부품이 문제없이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학생은 고객 컴플레인을 막기 위해 매장에 먼저 출근한다. 그들은 같은 나이지만, ‘수험생’이라는 말을 허락받지 못한 또 다른 열아홉이다.
이 장면은 우리 교육이 여전히 한 가지 잣대로만 청소년의 삶을 바라보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대입 중심의 시선”이라는 잣대는 너무 강력해서, 그 틀에 들지 않는 청소년들은 쉽게 가려지고, 종종 ‘관리의 대상’으로만 머물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모든 아이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모든 열아홉 살을 위한 교육이 되고 그들이 자신만의 출발선에서 존중받을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 선택의 다양성을 ‘선택’이 아니라 ‘권리’로 재구성해야 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찍부터 노동과 직업을 고민한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에 사회가 충분한 격려와 응원, 신뢰와 가치를 부여하는가? 독일이나 스위스의 이원화 직업교육처럼, 학교–기업–지역사회가 하나의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모델은 이미 세계 곳곳에 있다.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다. 어떤 지방 중소기업은 지역 특성화고와 협약을 맺고 학생들이 실습 단계부터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취업 후 3년 내 이탈률이 크게 줄고, 기업은 안정적 인력을 확보했다. 이제 이러한 모델이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 되어야 한다. ‘대학이냐 취업이냐’가 아니라, 각자가 선택한 길을 사회가 함께 키워 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직업교육을 ‘빠른 사회 진출’이 아니라 ‘충분한 성장의 시간’으로 바라봐야 한다.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의 이야기는 직업교육이 여전히 ‘미비한 안전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단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실습이라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 한 지역 특성화고는 이를 바꾸기 위해 ‘현장실습 안전 동행제’를 도입했다. 교사가 학생의 첫 출근에 동행하고, 실습기간 동안 사업장과 주기적 상담을 진행한다. 이 제도는 실습 중 조기 이탈을 낮췄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도 크게 높였다고 한다. 이처럼 아이들이 현장을 ‘두려움’이 아니라 ‘배움의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호 장치가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셋째, 모든 열아홉에게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수험생 중심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다른 길을 걷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쉽게 지워진다. 그러나 아이들의 말이 살아야 그들의 삶이 존중받는다. 한 특성화고에서는 매주 금요일, 학급이 ‘직업 생활 일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 학생들은 실습장에서 겪은 부당함, 성장의 기쁨,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나누며 서로의 세계를 이해한다. 어떤 학생은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묻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열아홉의 삶을 다시 인간적인 결로 되돌리고 있다.
넷째,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사이의 벽을 낮추고 ‘이동의 통로’를 보장해야 한다. 열아홉이 선택한 길이 곧 평생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을 가고 싶다면 갈 수 있어야 하고, 현장 경험을 쌓은 뒤 뒤늦게 학업을 선택해도 얼마든지 인정받아야 한다. 이미 일부 대학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력과 숙련 기술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확산된다면, 아이들은 ‘지금의 선택이 곧 미래의 제한’이 아니라, ‘경험의 축적이 미래의 확장’이 되는 교육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영화 〈3학년 2학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왜 우리는 여전히 열아홉 살을 한 종류의 삶으로만 상상하는가?” 수능 날 시험장 밖에서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이들도, 누군가의 기대와 꿈, 그리고 삶을 가진 또렷한 존재들이다. 그들의 선택이 존중받고, 그들의 일상이 교육의 한가운데 놓일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열아홉 살을 위한 교육’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TV속 수능 날의 뉴스 장면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열아홉의 선택이 소외감과 열등감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이분화된 사회라 할 것이다.
결론하여 수능을 치른 열아홉에게 보냈던 응원과 격려만큼, 수능을 치르지 않은 열아홉에게도 똑같이 관심과 응원, 격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응원은 제도와 안전망, 사회적 인식, 그리고 교육의 철학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진짜 힘을 가진다. 모든 열아홉이 어느 자리에서든 “나는 지금 배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 독일과 스위스, 핀란드와 같은 그런 교육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결코 영화 속 이야기여서만은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현실의 폭과 깊이를 넓혀야 한다. 아니 어느 면에서는 ‘학벌 타파’를 선도하는 열아홉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수요와 공급의 건전한 균형을 무너뜨린 이 땅의 과도한 대학 진학에의 욕망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전재학 칼럼니스트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학 석사
· 인천과학고 외 7개교 영어교사
· 제물포고등학교, 인천세원고 교감
· 인천 산곡남중 교장
· 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 주간교육신문, 교육연합신문 외 교육칼럼니스트 활동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