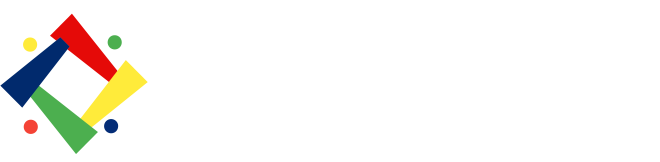올해도 어느덧 시월까지 오게 되었다. 한 해가 ‘시작!’ 하면 무섭게 달려가니 ‘벌써?’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된다. 이제 새달인 시월을 맞이하면서 달력을 훑어본다. 시월은 이른바 ‘빨간날’이 이틀이나 된다. 게다가 올해는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사흘이나 빨간날이다.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참 의미심장한 날들이다. 모두 ‘우리나라’의 ‘존(存)’, ‘립(立)’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지니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라는 말을 하니, ‘우리나라, 저희 나라’ 같은 표현 문제가 떠오른다. 이들 표현을 놓고 설왕설래했던 적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사람들인 우리는 ‘우리나라’라고 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우리’와 ‘나라’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한 단어)이다. 대명사 ‘우리’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 학교, 우리 엄마’ 같은 경우가 아니고, 대명사 ‘우리’와 명사 ‘나라’ 각각의 뜻을 넘어서 “우리 한민족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이르는 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닌 합성어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한국은 사계절이 있어요.’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라고 하면 된다.
그럼 ‘저희 나라’는 쓰이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한 단어가 아니니까 대명사 ‘저희’와 명사 ‘나라’의 뜻을 각각 나타낸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말할 때에 대명사 ‘저희’를 써서 ‘저희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특별한 뜻을 지니게 된 하나의 단어이고 ‘저희 나라’는 각각의 뜻을 나타내는 두 단어이니, 이 둘은 ‘높임말이나 낮춤말’ 관계로 묶이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들만 쓸 수 있는 말인 것이다.
그럼 우리는 늘 ‘우리나라’만 쓰고 ‘저희 나라’는 쓸 일이 전혀 없을까? 사실상, 우리가 대명사 ‘저희’를 써서 ‘저희 나라’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 굳이 그 예를 찾자면, 잘 아는 외국인 노교수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저희’를 써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 ‘외국인 노교수’를 상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는 있겠다. ‘(교수님의 나라인) 어디는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는 이러한데요.’처럼 말이다.
‘우리나라’가 품은, ‘우리 한민족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라는 말을 편안한 마음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월에 들어 있는 뜻깊은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사랑’이 가을처럼 무르익어 가면 좋겠다.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