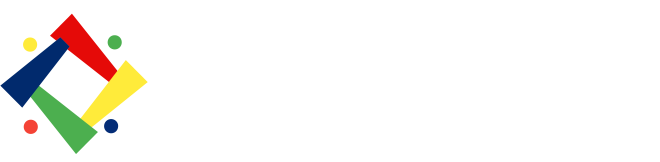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금처럼 말은 했어도 그 말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다. 내가 하는 ‘말’을 ‘글’로 적을 수 있다는 건, 실로 대단한 일이다. 그 일은 바로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우리말을,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고 외국 사람들은 쉽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는 문법 대상으로서 우리말을 대하는 일이 많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처럼 해당 언어를 그 나라의 자음과 모음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즉 ‘소리’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일단 집중하기 때문이리라.
우리말이 쉽다는 건 소리를 그대로 자음, 모음이라는 기호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글을 ‘표음 문자(表音文字)’라고 하는데, 이는 소리가 있으므로 글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며, 소리와 표기의 상호작용이 활발함을 의미한다.

그럼, ‘돐’로 쓰이던 말이 ‘돌’이 된 이유는... 바로 ㅅ을 발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예전에는 겹받침의 ㄹ과 ㅅ을 모두 발음했지만, ㅅ을 발음하지 않게 되니 그 발음을 표기할 이유는 사라졌고 그래서 표기는 ‘돐’에서 ‘돌’이 된 것이다.
‘돐’이 ‘돌’이 되었다고 해서 아쉽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소리를 바르게 내야, 즉 발음을 바르게 해야 표기가 보전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다 언젠가는 ‘돐’이 ‘돌’ 된 것처럼 표기가 달라질라... 하고 생각되는 단어가 여럿 있는데, 대표적으로 ‘닭, 무릎’이다. ‘닭’으로 쓰는 이유는 [달기], [달그로]로 소리 냈기 때문이다. 즉, ㄹ과 ㄱ이 모두 소리 나기 때문에 ‘닭이, 닭으로’처럼 ‘닭’으로 쓴다. 하지만 [다기, 다그로]로 발음한다면 ㄹ을 쓸 근거는 사라지고 말아서 ‘닥이, 닥으로’처럼 ‘닥’으로 적게 된다. ‘무릎’ 또한 [무르피, 무르페]로 소리 나므로 받침을 ㅍ으로 써서 ‘무릎’이 된 것인데, 이를 [무르비, 무르베]로 소리 낸다면 ‘무릎’이 아니라 ‘무릅’이 된다.
‘빗, 빚, 빛’도 한번 보자. 이들 받침은 각각 ㅅ, ㅈ, ㅊ으로 다르다. 이는 각각 [비시, 비지, 비치], [비슬, 비즐, 비츨]로 소리 났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빗이, 빚이, 빛이’를 모두 [비시]로, ‘빗을, 빚을, 빛을’을 모두 [비슬]로 발음하는 경우도 흔히 접하게 된다. 그런데 발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훗날 언젠가는 머리빗도 ‘빗’, 남에게 갚아야 할 돈도 ‘빗’, 반짝이는 광채도 ‘빗’으로 표기되고 말 수도 있다.
‘닥’이 아닌 ‘닭’이 좋고, ‘빗’이 아닌 ‘빛’이 좋다면, 이제부터 우리말 발음을 제대로 해 보자.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말 소리를 지키면 우리글인 한글도 잘 보전되겠구나! 하는 뜻깊은 마음가짐을 지니고 말이다. 그럼 우리 모두 다짐하는 차원에서 발음 연습을 해 보자.
닭을 기른다. ⇨ [달글] 기른다. [다글](×)
흙으로 만든 토기 ⇨ [흘그로] 만든 토기 [흐그로](×)
무릎이 튼튼하다. ⇨ [무르피] 튼튼하다. [무르비](×)
부엌에서 요리를 한다. ⇨ [부어케서] 요리를 한다. [부어게서](×)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