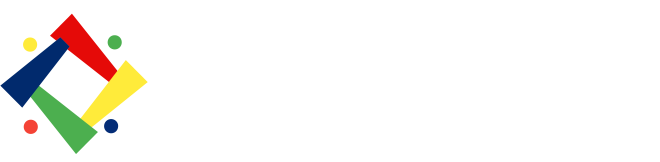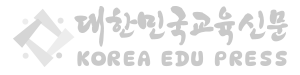생(生)이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마디가 있다.
“할매는 이제 새로운 여행을 하러 가는 거잖아.”
엄마가 떠나던 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이가 한 말이다.
아이의 그 말은 황망한 상황에서도 내 가슴에 새겨졌던 것일까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상념에 잠길 때면 어김없이 되살아난다. 중학교 1학년인 아이는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늘나라에서 이제 편안하실 거라는 말도 아니고 여행을 한다니,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었을까? 난 아이에게 삶은 여행이고 죽음은 다른 생을 위한 여정일 뿐이라는 비슷한 얘기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다.
그날 이후, 내 생에서 가장 가깝고 사랑했던 사람, 엄마를 떠나보내고 과연 죽음은 무엇인가를 자주 생각했다. 왜 그렇게 가슴이 찢기는 것같이 아프고 슬픈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상실감으로 다가왔던 건지를.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현생에 지은 업(業)에 따라 다음 생에 태어나는 윤회(輪廻)는 있는가? 그도 아니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까지도 사라지는 것인가를 말이다.
사실 내겐 죽음 이후의 내세관이라고 해 봐야 별다른 게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성경 속의 하느님 말씀과 불교 경전의 부처님 말씀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곤 했지만, 종교적으로 하느님과 부처님을 섬기거나 믿고 의지하지는 않는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미지의 영역이라는 사실이 두렵긴 했지만, 어느 쪽으로도 마음이 기울지 않았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견딜 수 없이 슬프고 깊은 상실에 빠졌던 걸까? 지금 생각해 보면 죽음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는 것, 나 역시 언젠가는 가야 하는 길이라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주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남은 이들에겐 세상 어디에서도 다시 만나 함께 할 수 없다는 상실감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슬픔에 빠진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시간이 필요하다. 나 역시 그랬으리라. 오롯이 상실감과 슬픔에 나를 던져놓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과연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슬픔의 근원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상실감이 나에게 가장 컸다. 그것을 제외한다면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아이가 말한 것처럼 생을 여행으로 보기 시작했음을 깨닫는다. 이미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몸은 소멸해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을 선택한다고 말했지만, 그때까지는 단지 책 속의 글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의식의 변화는 아이러니하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는 상실감 속에서 피어났다.
몇 번을 꿈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엄마는 언제나 기쁨에 겨운 듯 활짝 웃고 있었고 여행자처럼 보였다.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이 꿈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어떤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된다.
웨인 W. 다이어와 에스더 힉스가 함께 쓴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에서 우리는 자신이 태어날 줄 알았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완벽하리란 것도 알고 있었다고 적고 있지 않은가?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이다. 난 엄마가 아름다운 여행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기에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프진 않다.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생은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는 여행의 중심에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의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이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지금 생의 여행자가 되어 그 답을 찾아갈 것이다.

김연희 작가는
글 쓰는 순간이 행복해서 계속 씁니다. 마음과 영혼을 이어주는 글을 통해 의식 성장을 하며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작가로 살아갑니다.
브런치 작가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치유글약방> 2023, <성장글쓰기> 2024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