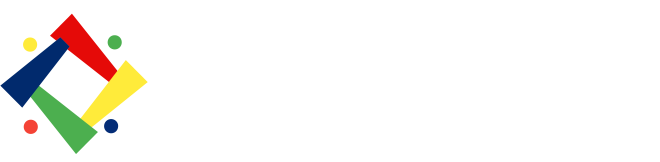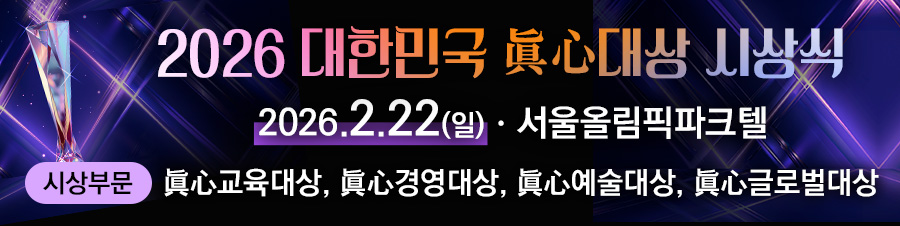몇 아이들이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줄줄이 불려오고 부모들이 소환된다. 아이들은 별반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어떻게 하면 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까 머리를 굴리며 궁리만 하는데 문밖에선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엄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쥐구멍을 찾는 엄마들이 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자식을 잘 못 낳은 죄? 아니면 잘 못 기른 죄? 죽어라 뒷바라지 한 죄? 도시 모를 일이다. 그 중 한 아이는 문득 지난겨울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신입생 모집이 막바지에 이르던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자신을 퇴임 교장이라고 밝힌 그분은 우리 학교에 손녀딸의 입학을 간절히 원했다. 이러저러한 사정을 물은 다음 성적도 저조하고 학생부 기록이 너무 나빠 어렵겠다고 정중히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은 눈이 많이 내리고 무척 추웠다. 아직 양지도 올라오기 전 꽤 이른 시각에 손님이 찾아왔다. 어제 그 노인이었다.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연만한 팔순의 노인이 그것도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어르신이 모자를 벗어 들고 문밖에서 나를 찾았다. 안으로 맞아들이자 눈가에 이슬이 맺히면서 가정사를 얘기했다.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며느리는 떠나고 아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지라 손녀딸을 자신이 맡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공부가 뒤떨어졌노라고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자식뻘 되는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한 번 눈물을 글썽였다. 훗날 우연히 듣게 된 사연은 그 노인의 다른 자녀들은 법조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유독 이 아이의 가정만 곤경에 처해 있다고 했다. “자식을 잘 못 둔 제 죄입니다. 부디 선처해 주십시오.”
노인이 떠나고 나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한편에선 결코 평범하지 않은 아이의 외모와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반항적인 표정, 다른 한편으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던 노인의 얼굴이 오버랩 되었다. 노인이 현역 시절이었다면 나는 햇병아리 새내기였을 것이다. 깊은 고민 끝에 내가 지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아이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성장기에서 유난히 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생각하기로 했다.
언제나 봄이 되면 학교 앞 문구사에서 병아리를 팔았다. 우리 아이들은 천원에 두 마리 하는 병아리를 넋을 잃고 바라보다 유혹을 못 이겨 사 오곤 했다. 대부분은 이틀이나 사흘 지나면 슬픔만 남긴 채 죽고 만다. 아이는 또 울면서 병아리를 묻고 나뭇가지로 십자가를 세운다. 그러나 좁쌀과 파리로 연명하던 병아리가 어쩌다 살아남기라도 하면 뛸 듯이 기뻐했다. 학교에 데리고 가겠다고 떼를 쓰다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학교로 향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보다도 먼저 병아리의 안부를 살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병아리 티를 벗을 무렵이면 녀석은 키가 훌쩍 커지면서 털이 빠지고 얼마나 밉상으로 변하는지 어느새 거들떠보기도 싫어진다. 외모만 미워지는 게 아니라 천방지축 말썽꾸러기가 된다. 그렇게 사랑은 미움이 되어 까맣게 잊고 지내기를 얼마일까? 못생긴 녀석은 어느새 머리에 붉은 볏을 단 늠름한 닭이 된다.
때때로 아이들이 미워 죽겠는 때가 있다. 아침저녁으로 잔소리를 해대지만 전혀 아랑곳 않는 녀석들, 하지 말란 짓만 고르고 골라서 해대는 녀석들, 사람 되기는 애시 당초 글러먹은 싹수가 노란 녀석들-

그러나 지금 녀석들은 성장기를 지나며 털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3-4년, 혹은 5-6년 쯤 뒤 스승의 날에는, 어쩌면 그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지만 늠름해진 녀석들은 멋쩍은 표정으로 불쑥 나타난다. 아니면 바람결에라도 소식을 보내온다. 털갈이를 할 동안만 눈 질끈 감고 봐내자.

▲ 최홍석 칼럼니스트
최홍석
전남대학교 국문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
호남삼육고등학교 국어교사
서울삼육고등학교 국어교사
호남삼육고등학교 교감 및 교장 정년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