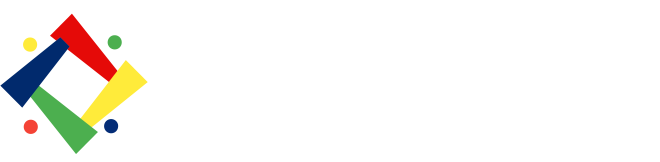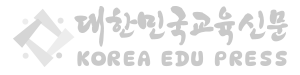중국의 전국 시대, 초(楚)나라의 화씨(和氏)란 사람이 산 속에서 옥(玉)의 원석을 발견하여 여왕(藇王)에게 바쳤다. 여왕이 보석 세공인에게 감정을 시켰더니 보통 돌이라고 했다. 화가 난 여왕은 화씨를 월형(刖刑 발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에 처했다. 여왕이 죽고 무왕이 즉위하자 화씨는 그 옥돌을 무왕(武王)에게 바쳤으나 이번에도 옥 세공인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감정을 했고 이번에는 나머지 발뒤꿈치를 잘리고 말았다.
무왕에 이어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화씨는 그 옥돌을 끌어안고 초나라 산 아래서 사흘 밤낮 을 울어 나중에는 눈물이 마르고 피가 나왔다. 이 소문을 듣고 문왕이 사람을 보내 그 까닭을 묻자 자신은 ‘형벌을 받아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옥을 돌이라 하고 올바른 사람을 미친놈이라 욕하는 것이 슬퍼서 우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감동을 받은 문왕이 옥돌을 세공인에게 맡겨 갈고 닦게 하니 천하에 둘도 없는 명옥이 영롱한 모습을 드러냈다. 문왕은 곧 화씨에게 많은 상을 내리고 그의 이름을 따서 이 명옥을 '화씨지벽(和氏之璧)'이라 명명했으니 저 유명한 화씨의 옥이다. 《한비자》 화씨(和氏)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화씨지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옥은 조나라의 혜문왕 때 조나라로 건너갔고 이 소식을 들은 진나라의 소왕은 성 15개와 옥을 바꾸자는 제안을 하며 속임수로 빼앗을 궁리를 하고 조나라의 사신 인상여의 용기와 담력으로 되 찾아오는 과정에서 ‘완벽(完璧)’ ‘하자(瑕疵)’와 같은 단어가 생겨나는 등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 이 옥이 얼마나 대단한 옥이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모두들 이 옥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형편없는 안목(眼目)으로 한 사람의 일생을 불행에 빠뜨린 세공인의 과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안목(眼目)’이라는 것은 정치가에게나 사업가에게나 모든 이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눈앞의 현상 보다는 향후의 변화와 결과를 내다볼 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안목이 더욱 필요한 곳은 교육계이다. 교육의 성과는 정치나 사업의 그것 보다 훨씬 더디 나타나기 때문이다. 에디슨이나 저커버그는 모범생도 잘 적응하는 학생도 아니었다.
일본에 빼어난 불상 조각가 스님이 있었다.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스님은 말했다. 일주일이고 이 주일이고 돌덩이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속에 갇힌 부처님이 보이고 그 부처님을 꺼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안목이다. 미켈란젤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버려진 대리석 속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를 가두고 있는 돌조각을 떼어냈더니 그 속에서 모세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유명한 모세상에 관한 일화이다.
교육(敎育)이라는 개념을 동양적인 사고는 공익(公益)적 차원에서 한 인간을 가르쳐서 국가나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기른다는 것인데 자칫 다람쥐에게 수영을 오리에게 나무타기를 강요할 우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서양에서는 개인적(個人的)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한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이 발현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진정한 교사가 되려한다면 매일 만나는 악동들에게서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이 아이들을 가두고 있는 여백을 떼어내고 아이들이 걸어 나오도록 도와야 한다. ‘나무는 겨울에 자르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어느 것이 죽은 가지인지 어느 것이 살아 있는 가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은 천방지축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봄이 되면 잎을 내고 꽃을 피울 지도 모른다. 도토리 속에 있는 떡갈나무를 보는 안목을 기르자.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는 격언을 되새기자.

▲ 최홍석 칼럼니스트
최홍석
전남대학교 국문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
호남삼육고등학교 국어교사
서울삼육고등학교 국어교사
호남삼육고등학교 교감 및 교장 정년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