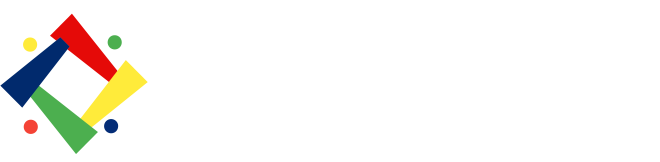말, 그 무게
가을을 재촉하듯 선선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오랜만에 선배 언니를 만났다.
늘 밝고 당당하던 그녀는 어딘가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장난치며 웃음을 유도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말이 없었다. 따뜻한 커피를 사이에 두고 창밖을 힘없이 바라보는 언니에게 조심스레 “무슨 일 있어요?”라고 물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요즘 사람들 말이 무서워. 그래서 요즘 많이 우울해”
“별말 아닌 것처럼 던지지만 듣는 나는 그저 작아지는 기분이야”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대화 중 툭 던지는 말투, 대놓고는 아니지만 미묘하게 무시하는 듯한 말, 회피하는 눈빛과 함께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말까지. 마치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는 듯한 말들이 조각조각 모여 언니 마음 어딘가를 갉아먹고 있었다.
“별거 아닌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계속 남아. 그리고 하루 종일 반복해서 생각나”
나는 그 순간 말이라는 게 얼마나 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지 다시금 느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는다. 그 말 중 대부분은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어떤 말들은 그러하지 못하다. 어떤 말은 마음에 박힌 채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자꾸만 그 장면과 감정을 떠올리게 만든다.
가끔 말은 너무 가벼워서 문제고, 너무 무거워서도 문제다. 우리는 종종 그 경계를 모른 채 누군가의 마음을 툭, 하고 건드린다.
'이 정도 말은 농담이지', '저 사람은 강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쉽게 넘기지만, 말이란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강하다.
그날 나는 말 대신 긴 침묵으로 언니 곁에 앉아 있었다. 말로 다 닿을 수 없는 감정이 있다는 걸 알기에, 섣불리 위로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언니의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여, 결국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언니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돼요. 어떤 말도 언니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는 없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그러나 무언가를 조금 내려놓은 듯한 얼굴이었다. 그날의 짧은 대화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했겠지만, 말의 무게가 반드시 누군가를 짓누르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다.
우리는 늘 말 속에서 살고 있다. 누군가의 한 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차가운 한 마디에 하루가 무너질 때도 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무게가 존재한다. 때로는 돌보다 무겁고, 때로는 깃털보다 가볍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말을 내뱉게 되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에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소한 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자존감의 바닥을 흔드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가능한, 내 말이 누군가에게 '약'이 되기를 바라본다.

황미희 작가
◆ 약력
· 행정안전부 보건안전강사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강사
· 행정안전부 일상생활안전강사
·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강사, 의료관리자, CS, 리더십 강사
· 응급구조사
· 의료관리자
· 2025 대한민국 眞心교육대상 수상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