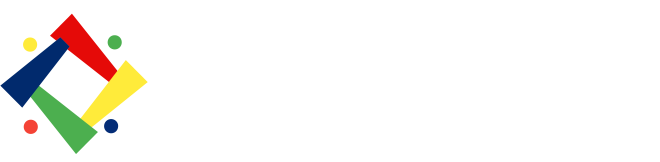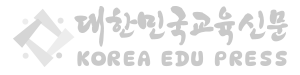춘추전국시대를 살았던 오자서(伍子胥 BC?-BC484)는 사마천이 『사기열전』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공자가 『춘추』에서 매우 우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문무를 겸한 인물로 용맹하고 지략 또한 뛰어나서 오나라 왕 합려를 도와 오나라를 춘추오패의 자리에 올려놓은 인물이기도 하다. 사마천이 사기 열전(列傳)을 편집할 때 오자서를 맨 처음에 수록하려 했을 만큼 불세출의 영웅이었지만 ‘백비(伯嚭)’라는 간신을 오왕 합려에게 천거하는 과오를 범했기에 열전의 첫 자리는 백이숙제(伯夷叔齊)에게 넘어갔다.
그는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고 명문 귀족 출신이었다. 그러나 간신 비무기의 모략에 빠져 아버지와 형을 잃고 천신만고 끝에 오나라에 망명을 했다. 그리고 기반을 닦은 다음 원수를 갚기 위해 초나라를 공격한다. 그때 오자서의 둘도 없는 친구 신포서(申包胥)가 ‘신하였던 사람이 그의 주군과 조국을 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간곡히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 때 오자서는 “일모도원(日暮道遠) 도행역시(倒行逆施)”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신포서의 만류를 뿌리치고는 초나라의 수도로 진격을 했다. 그 말인즉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무니 모로든 거꾸로든 갈 수 밖에 없다’ 는 말이다.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다.
그러나 초나라 정벌에는 성공하였으나 원흉인 초나라의 평왕(平王)은 이미 죽고 그 아들 소왕은 도망을 가고 없었다. 오자서는 비밀리에 묻어둔 평왕의 무덤을 찾아 시신을 나무에 매달고 구절동편(九折銅鞭- 아홉 마디로 된 구리 채찍)으로 삼백 대를 때려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 이른 바 부관참시(剖棺斬屍)를 행했다.
한편 신포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진나라의 애공(哀公)을 찾아가 원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칠 일 동안 울며 음식을 먹지 않았고 이에 감동을 받은 애공에게 군사를 얻어 초나라를 구했다.
오자서가 부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초나라를 짓밟고 부관참시를 자행한 일에 대하여는 매사가 그렇듯이 세인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당연한 처사라느니 도에 지나치다느니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모도원 도행역시’라는 그가 남긴 말은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에는 우려되는 바가 있다. 피맺힌 원한은 넉넉히 짐작되는 바이지만 날이 저물어 가고 갈 길이 멀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대부의 도리나 낡은 대의명분 따위를 운운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목표가 됐든 사업의 목표가 됐든 목표 자체가 훌륭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것이 비록 훌륭한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또한 못지않게 옳아야 한다. 근자에 많은 이들이 인식 속에서 목표 자체만 그럴듯하면 약간의 편법은 융통성이라는 미명하에 용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날이 저물고 갈 길이 멀다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목적이 선하다고 하여 옳지 않은 과정이 묵인된다면 결과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인디언들은 사람의 마을을 그릴 때 어린이의 마음은 세모로 어른들의 마음은 동그리미로 그린다고 한다.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은 뾰족한 모서리가 있어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지만 닳고 닳은 어른들의 마음은 둥글둥글하다는 것이다. “엄마 찾는 전화가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라.” “버스 탈 때, 식당이나 목욕탕 갈 때 학교 안 다닌다고 그래.” 이러저러한 요령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점점 둥글어 진다. 지금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훗날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자.

길이 멀다고 하여 길이 아닌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자.

▲ 최홍석 칼럼니스트
최홍석
전남대학교 국문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
호남삼육고등학교 국어교사
서울삼육고등학교 국어교사
호남삼육고등학교 교감 및 교장 정년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