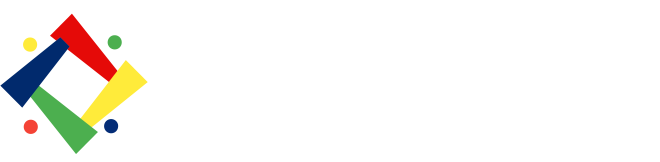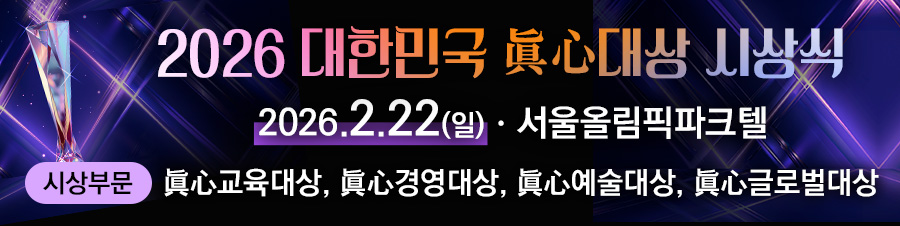엄마를 부르는 계절
햇살이 유난히 좋았던 어느 가을날 오후,
카페에서 만난 딸아이는 평소 즐겨 마시는 커피 대신 건강차를 주문한다.
조금 의아하다. 추운 겨울날에도 아이스아메리카노 커피를 즐겨 마시던 아이이기 때문이다.
항상 밝고 명랑한 아이였는데, 그날 따라 왠지 모르게 진지해 보였다. 딸아이는 찻잔을 매만지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머뭇거리며 말했다.
“엄마...나... 임신했어.” 수줍은 듯 조용히 가방에서 임신테스트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 짧은 한마디에 내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벅참이 파도처럼 밀려 오고 있었다.
딸이 엄마가 된다는 사실.
내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기만 한 딸이 아기를 품었다는 일이 신기하기만 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또 다른 생명을 책임질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 순간, 잊고 지냈던 시간의 무게를 실감했다.
‘이제 정말 세월이 흘렀구나’
그 감동 속에서, 불쑥 한 사람이 떠올랐다.
그리운 나의 어머니.
딸의 임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이름.
치매로 서서히 기억을 잃고, 결국 나를 떠났던 엄마.
엄마라 부르면 늘 따뜻하게 돌아보시던 그 얼굴이 그리웠다.
이제는 미치도록 목을 놓아 불러도 들을 수 없음을 알지만, 엄마의 그 고운 목소리가 내 귓가에 여전히 들리는 듯하지만, 부질없이 흐르는 내 눈물 속에서 엄마와의 기억을 애써 꺼내 본다.
손주들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 늦은 밤 이유식 끓이며 부르던 조용한 콧노래 소리까지.
그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그리고 그리움에 젖은 마음이 아련해진다.
엄마가 곁에 있었다면, 이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외손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얼마나 환하게 웃으셨을까?
또 얼마나 귀한 말씀들과 따뜻한 위로를 내 딸에게 건네주셨을까?
30년 전, 내가 딸을 가졌을 때, 엄마도 지금의 내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
세월은 무심하게도 흘러 내 머리에도 흰 눈이 내렸다. 비록 엄마는 곁에 없지만 나는 조금씩 엄마를 닮아가고 있었다.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모습,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어리둥절할 눈빛도 모두 낯설면서도 눈물 나게 사랑스러울 것 같다.
엄마가 나를 품었다.
나는 딸을 안았고, 이제 딸이 또 한 생명을 품는다.
그 연결의 한가운데 나는 여전히 엄마의 딸이고 이제 막 외할머니가 되어가는 중이다.
기쁨은 때때로 그리움의 문을 연다.
나는 오늘도 딸아이의 배 속에서 자라고 있을 그 작은 생명을 상상하며 하늘에 계신 엄마를 불러본다.
엄마... ...

황미희 작가
◆ 약력
· 행정안전부 보건안전강사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강사
· 행정안전부 일상생활안전강사
·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강사, 의료관리자, CS, 리더십 강사
· 응급구조사
· 의료관리자
· 2025 대한민국 眞心교육대상 수상
[대한민국교육신문]